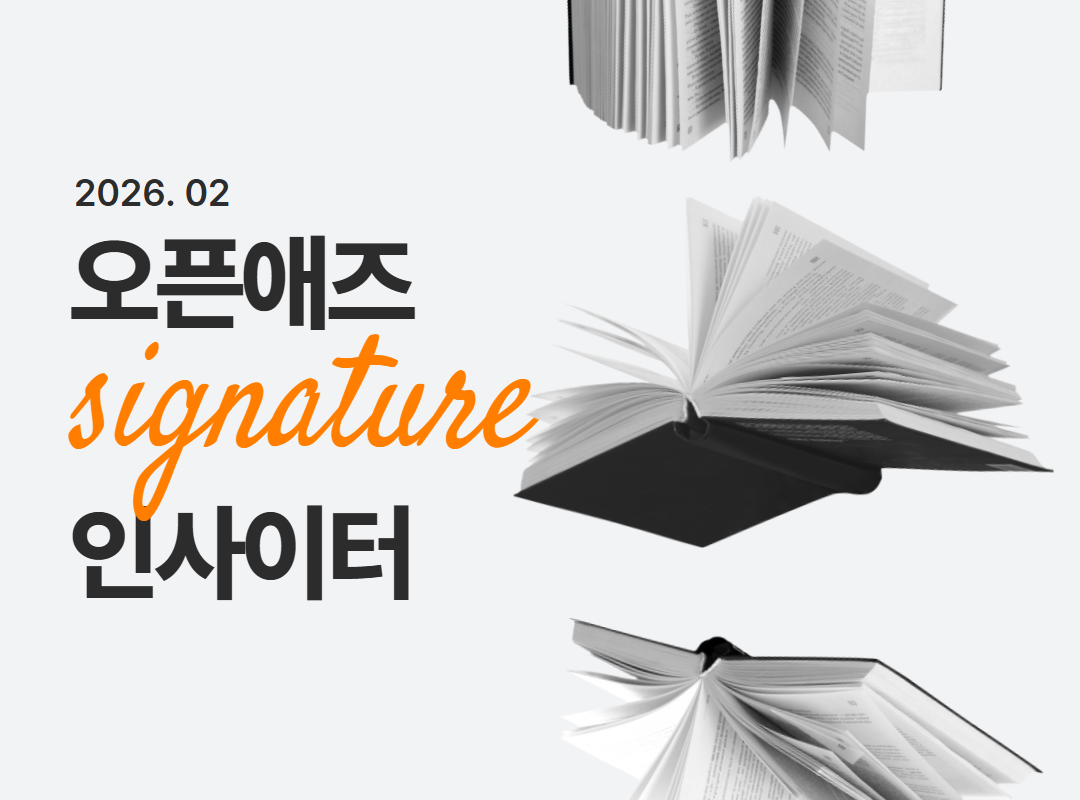'트렌드'를 벗어나 나다움을 만드는 방법
마케터로 일하면서 생긴 직업병 중 하나는 ‘트렌드 민감병’이다. 평소엔 관심이 없는 분야라도, 한 번 화제가 된 콘텐츠나 제품이 있으면 꼭 찾아보고 분석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가 ‘나노화’되면서 이제는 ‘트렌드’라는 말조차 무색해지고 있다. 같은 20대라도 성별, 소득 수준, 거주 환경, 가족관계, 직업, 주변 지인에 따라 관심사와 소비 패턴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한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트렌드를 쫓는 제품을 팔려 한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마치 그 제품을 쓰지 않으면 도태될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사실,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아도, 그 브랜드를 당장 구매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트렌드의 발뒤꿈치만 좇으며 사는 삶 속에서 진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바로 ‘나만의 취향’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 소비하다 보면, 나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알지만,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모르게 된다. 취향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오히려 개인적인 취향과 감각이 중요한 시대다. 생성형 AI가 확산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최적화된 선택을 하는 시대에는, 오히려 AI가 가질 수 없는 ‘감각’과 ‘주관’을 가진 사람이 더 돋보인다.
최근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소년, 실리카겔과 같은 밴드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명확한 취향과 고유한 스타일을 유지해온 팀들이지만, 오히려 대중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며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트렌드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 나만의 취향을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가성비’와 ‘최적의 옵션’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에게 가장 잘 맞고, 가장 저렴한 상품을 쉽게 고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AI 추천 시스템은 결국 ‘남들이 많이 선택한 것’을 나에게 제안하는 구조다. 콘텐츠 역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보다는, 이탈 가능성이 낮은 콘텐츠를 우선 추천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허용해야 한다. 취향은 실패에서 만들어진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곧, 내가 싫어하는 것과 불편한 것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 과정은 꽤나 지루하고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탐색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겪으며 우리는 점점 내 취향을 정제해나가게 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끌리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트렌드를 해석하는 힘이 생긴다. 따라가기만 하던 사람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준이 생긴 사람은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트렌드가 내 취향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자극제가 된다.
오늘도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있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내가 이걸 굳이 알아야 할까?
지금,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지?”
그 질문에서부터,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취향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