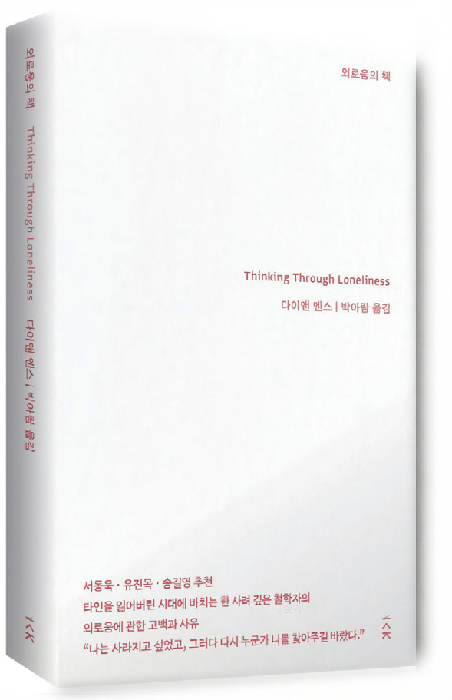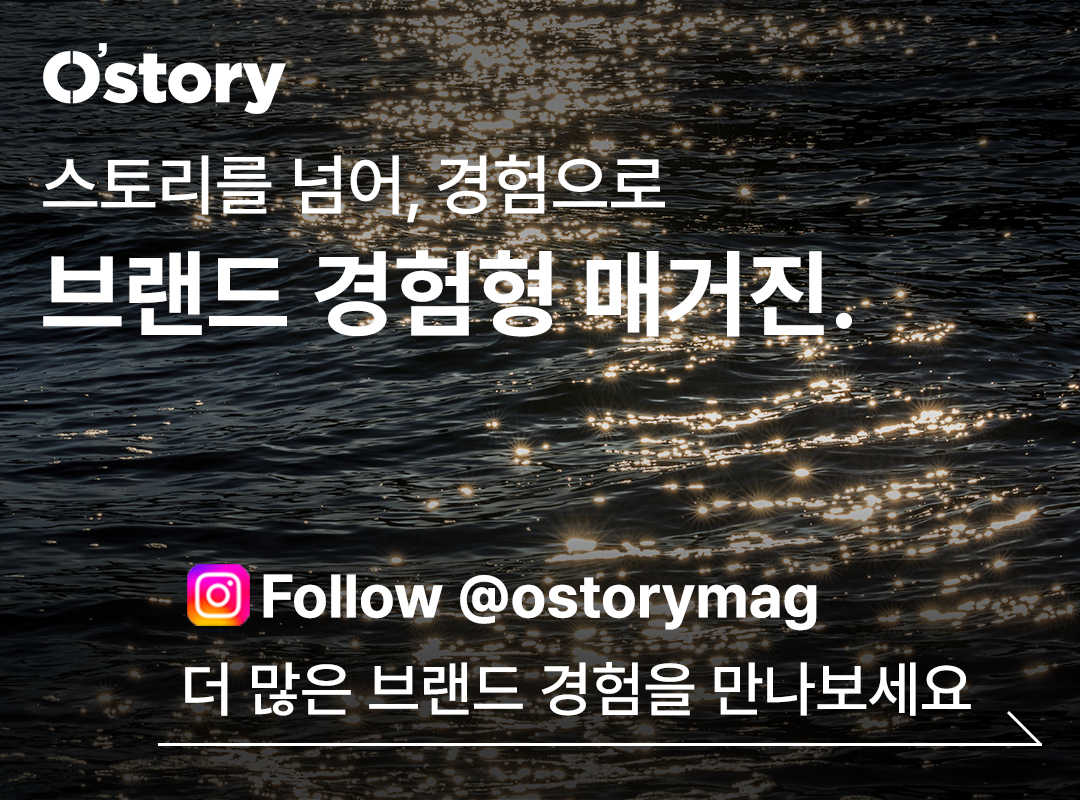상실, 고통, 고립, 무력. 나이가 든다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늙어간다는 건 꼭 그런 일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더 깊이 받아들이고, 성숙하게 경청할 수 있는 충만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귀를 기울인다는 건 타인을 위한 일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1인 가구의 시대, 혼자가 된다는 것
나 혼자 산다.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세대 2,411만8,928세대 중
1인 가구는 1,012만2,587세대에 달한다. 전체의 40%를 훌쩍 넘는 비율이다. 과거에는 4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족 단위로 여겨졌지만, 이제 4인 이상 가구는 394만 세대로 지난 4년 사이 70만 세대 가까이 줄었다.
한때 ‘핵가족화’가 시대적 변화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개인 가족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 역시 이 흐름을 뒷받침한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이는 UN이 정의한 초고령사회의 기준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그 가운데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중은 37.8%로 가장 높다.
혼자 사는 노인
이 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고립의 위험 또한 커진다. 결국 혼자 늙어간다는 사실은 단지 인구통계의 한 항목이 아니라, 노년이 외로움과 고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냉정한 사회학적 신호이기도 하다.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외계인 줄스, 경청의 은유
영화 <줄스>는 마치 <E.T.>의 노인 버전 같은 영화다.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 분턴에서 살아가는 노인 밀턴(벤 킹슬리)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뒷마당에 추락한 UFO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미지의 존재와 조우한다.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관계 당국에 신고하자 되레 장난 전화를 하지 말라는 역성만 듣는다. 그 와중에 기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 외계인을 내버려둘 수도 없다. 결국 그를 집에 들인 밀턴은 외계인에게 음식을 내주고, 유일하게 사과를 먹는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때가 되면 사과를 내준다. 좀처럼 말이 없고, 사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외계인과 뜻밖의 동거를 시작한다.
그러다 각기 다른 이유로 그의 집을 방문한 두 노인 샌디(해리엇 샌섬 해리스)와 조이스(제인 커틴)에게 외계인을 소개하게 되고, 세 노인은 논의 아닌 논의 끝에 외계인에게 줄스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외계인과 세 노인의 관계를 다룬 <줄스>에서 우주 SF는 하나의 수단이다. 매일매일 특별할 것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던 밀턴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외계인 줄스를 만나 예정에 없던 사건들을 겪는다. 그러면서 딱히 친분이 없던 노인들과 함께 외계인을 돌본다. 샌디와 조이스 역시 마찬가지다. 줄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매일을 별일 없이 살던 노인들이었다. 시의회에 출석해 동네에 필요한 개선책이나 요구하는 것이 소일거리였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외계인의 출현은 노인들의 일상에 활기를 돋우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건이다.
덕분에 마주칠 때마다 인사 정도나 나눌 뿐 별다른 대화를 나눈 적 없던 세 노인은 매일같이 만나 대화를 나눈다. 줄스가 나타난 덕분에 일어난 일이다. 감독 마크 터틀타우브는 이렇게 말했다. “노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건 친구나 연인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다. 줄스는 완벽한 경청자였다.” 그의 말처럼 줄스는 단순한 외계인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행위의 상징이다. 노년의 외로움은 말의 부재에서 오지만, 동시에 ‘들어주는 귀의 부재’에서 더 깊어 진다. 줄스는 말없이 존재함으로써 그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이고, 영화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관계의 본질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영화 <E.T.>가 외계인과의 우정을 보여준다면, <줄스>는 외계인과의 만남을 통해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 삶의 온기를 되찾는 순간을 드러낸다. ©Universal City Studios LLC and Amblin Entertainment, Inc.
새로운 관계를 배워가는 것
캐나다의 철학자 다이앤 엔스는 저서 <외로움의 책>에서 외로움을 “타인과의 친밀함이나 정서적 연결이 결여될 때 생기는 욕망”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외로움을 단순히 고립된 상태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외로움
은
인간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본질적 욕망의 표현이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우리를 성찰하게 만드는 감정
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고립이 곧 외로움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결핍의 시간이 아니며,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엔스는 “너무 오래 혼자 있어도, 너무 오래 함께 있어도 고통이 된다. 결국 인간은 그 두 극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균형감은 바로 그 사이 어딘가에서 형성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움에 익숙해진다. 친구의 부고 소식이 더 이상 드물지 않게 들리고, 함께하던 자리에서 한 명씩 사라진다. 가까웠던 관계들이 하나 둘 흐려지면서 남겨진 시간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그 고독은 결핍의 감정만은 아니다. 그것은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이가 든다는 건 결국 관계의 형태를 바꿔가는 일이다. 젊은 시절의 관계가 ‘함께하는 존재’였다면, 노년의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로 바뀐다.
외로움을 견디는 일은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가깝다.
타인의 외로움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외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공감의 언어를 배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주는 가장 깊은 성숙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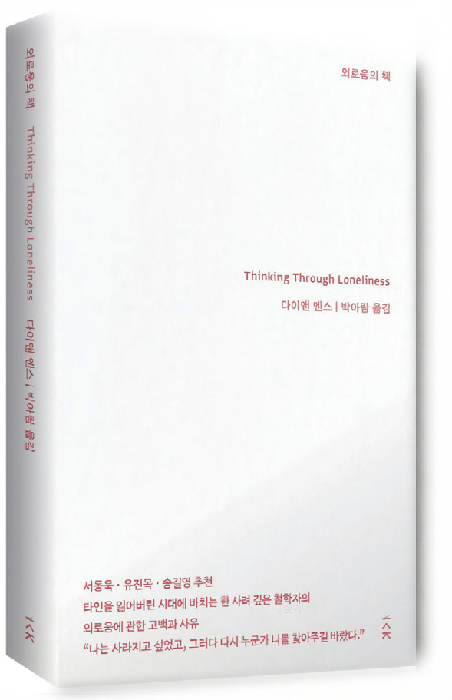
다이앤 엔스는 <외로움의 책>에서 외로움을 없애야 할 병이 아닌, 성찰적으로 마주하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감정으로 바라본다.
©교보문고
나이 듦으로써 삶은 완성되는 법
스위스의 심리학자 베레나 카스트는 저서 <나이 든다는 것에 관하여>에서 “죽음의 기술은 곧 삶의 기술이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노화를 질병이나 쇠퇴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또 다른 도전 과제가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정의한다. 젊음이 성장의 시기라면, 노년은 ‘완성의 시기’라는 것이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카스트는 강조한다. 젊은 시절에는 쥐고자 애쓰던 것들을 조금씩 놓아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그 자유는 허무가 아니라 남은 삶을 더 깊고 충만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바뀐다. 그녀는 또 애도를 인간이 가진 위대한 자산이라고 정의한다.
애도
는 단순히 상실의 감정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과 관계를 감사히 되새기고, 여전히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깃든 행위다. 누군가를 잃었다는 사실은 슬픔이지만, 그와 함께했던 기억이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카스트는 이러한 ‘감정의 순환’이 인간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고 본다.
“끝을 향해 가는 삶에 대한 애도는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감정”
이라는 그녀의 말처럼
노년의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깊은 연결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줄스>가 나이와 무관하게 공감대를 얻는 영화가 된건 결국 나이 드는 것이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사안. 어쩌면 미리 두려워지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 여기면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도 너르게 열릴 것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고로 조금씩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세상과 타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스스로의 삶도 보다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함께하는 삶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건 결국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일 것이다.
글. 민용준(대중문화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