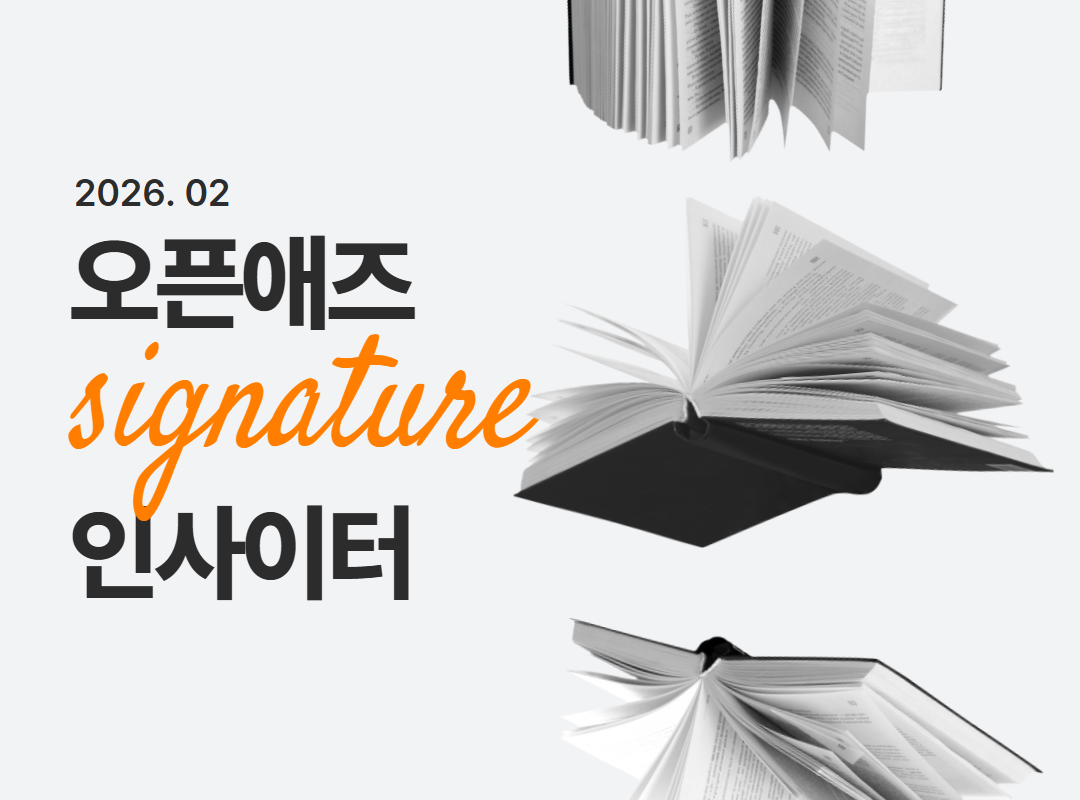📺넷플릭스 “볼 게 없다” 현상, 도대체 왜 그럴까?
- 한눈에 보는 핵심요약
- 이용자들 사이에선 “요즘 넷플릭스에서는 컨텐츠는 많지만 막상 볼 게 없다”는 말이 이른바 ‘밈’처럼 번지고 있어. 왜 그럴까?
📺넷플릭스 “볼 게 없다” 현상, 도대체 왜 그럴까?

OTT에서 무엇을 볼지 1시간이 넘게 고민하는 장면을 담은 유튜브 ‘피식대학’ 영상 이용자들 사이에선 “요즘 넷플릭스에서는 볼 게 없다”는 말이 이른바 ‘밈’처럼 번지고 있어. 사실 이건 단순히 콘텐츠가 부족한 게 아니라, 브랜딩·큐레이션·UI/UX에서 국내 OTT와 차이가 크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그 이유를 쉽게 분석해보려고 해.
🌀끝없는 선택지가 만드는 피로감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급 라이브러리를 갖췄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썸네일 몇 장과 끝없는 스크롤뿐이라 “볼 게 없다”는 피로감을 느끼기 쉬워. 전 세계 공통 알고리즘으로 ‘내 추천’, ‘오늘의 트렌드’, ‘신작’을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다 보니, 선택지만 많고 만족감은 줄어드는 이른바 “선택의 역설”에 빠지는 거지.
🌍넷플릭스 “글로벌 표준 알고리즘”의 장단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뒤 90개국 이상에서 글로벌 Top10에 진입한 태국 영화 “헝거”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건 넷플릭스가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큰 틀을 쓰기 때문이야. 추천 알고리즘, 데이터 모델, AI 기술 같은 핵심은 글로벌 표준으로 운영되고, 여기에 자막이나 더빙 같은 최소한의 현지화만 더해지지. 덕분에 특정 국가의 취향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청 패턴을 참고해 “글로벌 커뮤니티 기반 추천”을 경험할 수 있어. 덕분에 장점으로는 다른 나라 콘텐츠를 쉽게 접하고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기회가 많다는 거야. 반대로 단점은 지역별 세밀한 맥락이나 취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지.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폭은 넓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컨텐츠는 잘 안 보일 수 있어.
🎯한국 OTT의 뚜렷한 로컬 전략

반면 한국 OTT는 전략이 달라. 티빙은 예능·야구, 쿠팡플레이는 축구·가성비, 웨이브는 지상파 콘텐츠처럼 각자 뚜렷한 정체성을 내세워서 “이 플랫폼에서만 봐야하는 이유”를 만들어. 큐레이션도 장르별로 세밀하게 나누고, 본방송 알림이나 멀티뷰, 달력형 일정 같은 UI/UX 강점도 바로 체감돼. 결국 글로벌 표준에 기대는 넷플릭스와 달리, 한국 OTT는 현지 취향과 생활 패턴을 정교하게 반영해 더 설득력 있는 경험을 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어.
📊 콘텐츠 자본력 vs. 경험의 질
물론 자본은 넷플릭스가 제일 세지. ‘오징어 게임’, ‘킹덤’,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글로벌 메가 히트작은 넷플릭스니까 가능했잖아. 근데 사용자 경험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 한국 OTT는 특정 장르에선 넷플릭스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친근한 경험을 주거든. 그래서 콘텐츠 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넷플릭스가 아무리 작품을 많이 깔아놔도, 브랜딩·큐레이션·UX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두면 “볼 게 없다”는 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 그럼에도 넷플릭스를 끊지 못하는 심리는.... 혹시 소외감?

왓챠를 예로 들어볼게.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OTT 부문에서 무려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어. 이게 보여주는 건 단순히 자본력이 아니라 한국 취향에 맞춘 타겟팅과 서비스 경험이 충성도를 만든다는 거야. 왓챠가 넷플릭스보다 돈이 많아서 팬층을 확보한 게 아니라, 세심한 큐레이션과 로컬 맞춤형 전략으로 충성 팬덤을 쌓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 결국 넷플릭스를 계속 구독하는 건 작품의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전 세계 트렌드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다’는 집단적 심리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 핵심은 누가 더 나에게 맞는 경험을 만들어 주느냐
결국 “넷플릭스에 볼 게 없다”는 말은 아이러니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를 쥐고 있는데도 정작 내 취향에 맞는 건 잘 안 보이니까. 글로벌 표준 알고리즘 덕분에 다양한 나라 작품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세밀한 로컬 맥락이 부족해 이용자는 피로감을 느끼는 거지. 반대로 한국 OTT는 취향 맞춤 큐레이션과 생활 패턴에 맞춘 기능으로 더 직접적인 만족을 주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콘텐츠 양이 아니라, 누가 더 나에게 맞는 경험을 만들어 주느냐가 진짜 승부처가 될 거야.